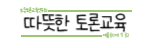2025. 6. 23. 22:05ㆍ따뜻한 토론교육 여름호(제7호)/토론 모임 이야기
고양토론모임은 둘째 주, 넷째 주 목요일에 만나요. 삶 나눔을 하고 교실에서 토론한 사례를 나누어요. 그리고 ‘토론이 좋아요. (김정순, 이영근, 에듀니티)’ 책을 읽고 공부합니다.
아래의 글은 2025년 5월 9일 고양토론모임 공부 이야기입니다.
고양토론모임 노기현
#토론 나눔
[1] 수나샘 토론 이야기 "초등학생이 연애를 해도 된다."

-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생각보다 연애에 대한 경험이 많았어요. 찬성 근거가 많을 것 같아서 찬성 이야기를 먼저 나누어요.
- 한 아이가 설렌다고 이야기해요. "뭐가 설레?" 그러면 그 아이가 답해요. "너넨 안 해봐서 몰라."
- 가볍게 만나는 아이들이 많아요. "연애하다 헤어지면 어색하지 않아?" 아무렇지 않다고 하는 걸 보니 추측할 수 있어요.
- 연애하면서, 그리고 친하다고 생각하면서 때리는 행동이 많다는 것을 느껴요. 때리는 것은 사랑과 애정의 표현이 아니에요.
- 오늘 짝 토론 수가 맞지 않아서 직접 참여했어요. 생길 수 있는 문제 상황들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어요.
- 첫째, 입안문을 너무 간단히 쓰면 논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이니 질문하지도, 대답하지도 못해요. 입안문을 너무 간단히 쓰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 둘째, 질문을 하면 "모르겠어요." 아주 귀엽게 대답해요. 순발력이라는 게 쉽게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껴요.
[2] 기현샘 토론 이야기 "급식 먹을 때 친한 친구와 먹어야 한다."
 |
 |
 |
- 칠판을 지우다 문득, 사진을 찍지 않았음이 떠올라 급하게 사진을 찍어요.
-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너무 만족해요. 불만이 없어요. 토론 주제가 생기지 않아요.
-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 토론 주제로 적당한 것을 이야기해 보라 말했어요. 그중에서 재미있어 보였던 것이 '학교 급식을 먹을 때 번호순으로 서야 한다.' 첫 번째 논제였어요.
- 아이들 반응이 뜨뜻미지근해요.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심지어 이야기하다 보니 토론 논제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반대 의견은 토의처럼 해결 방안들이 쏟아져 나와요. '망했다' 싶은 순간, '친한 친구'라는 단어에 아이들이 열광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논제를 바꾸었어요. "급식 먹을 때 친한 친구와 먹어야 한다."
- 갑자기 분위기가 후끈후끈 달아올라요. 그때 깨달았어요, <논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이에요.
- 치열하게 토론해요. 토론이 끝나면 삶으로 가져와요. 아이들은 '친한 친구와 먹어야 한다.'라는 의견에 대해 반대도, 찬성도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토의로 주제를 바꾸어요. 새로운 의견이 나와요. '역할을 정해둔다, 선착순으로 한다, 한 명씩 뒤로 돌아간다, 남녀 줄을 만든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때, 중요한 가치를 배워요. <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민주 사회에서는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을 만들기는 어렵다,>
- 다시 번호순대로 줄을 서고 있어요.
- 토론에 대해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짝 토론 질문하기에서 의미 없는 "왜"를 남발하는 질문이 많아요.
예) "왜 그렇게 생각했어?" -> "왜 첫 번째 주장과 같이 생각해?" -> "왜 두 번째 주장과 같이 생각해?" 연속 질문
답 1) '질문하기'가 아니라, '묻고 답하기'라고 이해시켜 주어요. 성을 쌓을 때는 항상 어딘가 부족한 구멍이 생기는데, 그 구멍을 크게 만들어서 상대방의 성을 무너뜨리는 놀이라고 설명해 주어요. "왜 성을 덜 쌓았어? 약하게 쌓았어?" 물어보아요. 부족하거나 미심쩍은 부분에 대해 질문을 해요.
답 2) <어떻게 질문해야 하는가?> 책 부분을 추천해요.
답 3) 육하원칙 여섯 가지를 생각해서 질문거리를 찾으라고 하면 좋아요.
답 4) 질문을 할 때는 항상 상대방의 핵심을 잡아서 핵심에서 궁금한 것,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 부분을 찾아서 메모해야 해요. 근거에서 무슨 질문을 만들 수 있는지 질문 목록을 만들어봐요. "좋은 질문은 뭘까? 안 좋은 질문은 뭘까? 상대방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뭘까? 나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야기 나누어요. 문장 하나에 질문 만들기와 같은 활동을 해요.
답 5) 반박하기를 카드로 반박 놀이를 추천해요. 4절지에다 근거 1, 2, 3 써서 옆 모둠으로 넘기고 상대방 근거를 보고 반박을 쓰고 다시 재반박에 반박을 반복해요.
답 6) 교사도 반박 연습을 해 보아요. "친한 친구랑 밥을 먹는 것만이 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일까요?". "맛없는 음식도 친구랑 먹으면 맛있어지나요?"
답 7) 근거를 흔들만한, 생각을 바꿀만한 질문의 신 찾기 놀이, 공격의 신, 방어의 신 등의 활동도 재미있어 보여요.
#토론 공부 - <토론이 좋아요. 3장>
<듣기>
1. 잘 듣기 : 주말에 한 일 듣기만 하다, 이제는 들으며 한 단어 쓰도록 지도하고 있어요. 잘 듣기를 가르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한지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2. 문해력, 독해력이 없으니까 문장을 들어도 핵심을 찾지 못해요.
3. 밑줄 긋기 독해도 좋은 방법이에요.
4. 우리가 잘 듣지 못하는 까닭에 대해 '몸과 마음이 피곤하여서'라는 말에 공감해요. 듣기란, 내가 들을 상황이 되어야 듣는 것이에요. 반대로 내가 말할 때는 상대방이 들을 상황인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해요.
5. 교과서는 한정적이에요. 끊임없이 말하는 태도, 듣는 기술, 듣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학교에서 하는 것은 그것의 장을 펼쳐주는 것이에요.
6. 보며 듣기, 쓰며 듣기, 대답하며 듣기, 질문하며 듣기 아이들에게 이론적으로만 가르쳐주지 않고, 이러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에게 칭찬하고 있나요? 듣기를 잘하는 학생을 칭찬할수록 더 그런 학생이 많아져요.
<말하기>
1. 혼자 말하기 / 짝하고 말하기 / 모둠하고 말하기 / 전체 발표하기 -> 3학년은 발표의 4단계를 꼭 가르쳐주어요.
2. 발표할 때 일어나면서 말하는 게 필요할까요?
-> 3학년은 필요해요. 6학년은 아니에요. 어릴 때는 공식적인 말하기를 배워야 해요.
-> 8명인 소규모 학급에서는 손을 드는 게 어색해요. 아이들이 애초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6년을 보내니 손들고 얘기하라 해도 하지 않아요. 대화가 겹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손들고 이야기하라고 말해요.
-> 생각해 보면 손 들고 발표하는 것 외에, 눈치껏 발표하는 태도도 필요해요.
3. 근거 만들기 전에 자료를 찾고 검색한 후 근거를 만들면 더 깊이 있는 생각이 나와요.
4. SOFTEN : Smile, Open Posture, Forward lean, Touch, Eye contact, Nod에 대해 매우 공감해요.
6. 상대방 말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 얘기 하기도 중요해요 "그건 ㅇㅇ님 말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