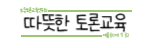2021. 12. 7. 16:23ㆍ따뜻한 토론교육 가을호(제1호)/토론 이야기

군포토론모임 오중린
결혼하고 1년 쯤 지났을까. 남편이 나에게 토론 공부하는 사람 맞냐고 했다. 차분하게 남편의 말을 들어주고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감정을 앞세웠겠지. 토론 공부한 지 2년은 되었던 것 같은데 창피했다. 그래서 더 성질을 냈던 것 같다.
영근샘이 늘 하시는 말씀, ‘토론은 삶이다.’에 동의한다. 머리로는 동의했지만 그 말이 내 태도나 삶에 스미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듯하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내 안에서조차 어떤 선택을 앞두면 갈팡질팡한다. 그럴 때 차분히 내 생각과 욕구를 잘 들어주어야 한다.
교실에서도 그렇다. 교실에서 실내화를 신지 않는 ‘맨발교실’을 하고 싶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도 하는 사람도 없고, 아이들도 나도 그런 경험이 없었다. 모임에서 먼저 맨발교실을 하시는 선생님들과 교실 바닥도 달랐다. 모임 선생님들께 이것저것 여쭈어보고 이주일 체험 뒤에 계속 맨발교실을 할지 말지 토론을 하기로 했다.
‘교실에서 실내화를 신자.(맨발교실 그만하자)’ 토론을 하며 ‘내가 생각했던 맨발교실의 장점을 아이들이 느끼고 있구나.’ 안도했고, 불편하거나 위험한 점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생각하게 되었다. 토론을 마친 뒤, 다수결로 계속 맨발교실을 하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리고 토론하면서 나왔던 맨발교실을 하면서 불편한 점을 어떻게 보완할지 상의했다.
맨발교실로 조금 지내다가 교실에서 교실용 실내화를 신고 싶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래서 또 ‘교실에서 교실용 실내화를 신어도 된다.’로 토론을 했다. 나는 처음에 교실용 실내화를 둘 장소가 마땅치 않고, 학부모님들께 괜한 경제적 부담을 드릴 것 같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맨발교실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닐지 걱정도 되었다. 나도 참여하고 싶은 마음을 꾹 참았는데 다행히 아이들끼리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내 궁금증이 다 해결되었다.
교실용 실내화를 신는 아이들이 생겨났고 덩달아 그 신발에 밟힌 맨발의 아이들이 생겨났다. 회의를 하고 규칙을 정했다. 11월이 되자 발이 많이 시려웠다. 발이 따뜻해야 건강하다는데 아이들 건강이 염려되었다. 그래서 다시 토론을 했다.
내가 맨발교실을 하자고 결정하고 교실용 실내화는 신으면 안 된다고 결정하고 발이 시려우니 이제 그만하자고 결정해버리면 굉장히 간단한 일이다. 하지만 나는 교실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선택은 교사 혼자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나는 조금 번거롭지만 토론을 통해 우리 공동체 모두의 의견을 적어도 ‘들어주기’라도 하는 선택을 한 것이다. 우리 반 학생들이 ‘나는 이 공동체에 소속되어있다.’는 마음이 들게 해주고 싶었다.
맨발교실 토론 중에 우리 반 스물여섯 명이 23:3으로 의견이 갈린 적이 있다. 논제가 무엇이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3:3대표토론을 했다. 대체로 학급회의에서 23:3은 23의 무게가 훨씬 무겁다. 하지만 3:3 대표토론에서 두 의견은 같은 무게가 된다. 토론 뒤 토의에서 23명의 의견대로 결정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토론을 통해 3명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다. 내 의견을 들어주는 것은 내가 공동체에 속해있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나는 토론이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내 삶에서 토론은 어렵다. 내 얘기에 반대하는 가족에 욱하고 친한 사람들 사이에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도 남편이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인정해준다. 토론과 내 삶 사이에 등호를 자꾸 얹어줘야지.